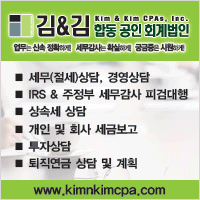박경숙 수필가
(서북미 문인협회 회원)
세월이
가도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이르렀다. 지나온 날들이 새삼스레 되돌아 보이는 언덕에 올라선 셈이다.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 나에게 허락한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세상 어디쯤 와 있는가?”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그 음성이 바로 내 것이라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고는 조급해지기 시작한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간은 어김이 없이 기다려 주거나 더디 가는 법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한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란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육십의 문턱에 선 내 나이, 사랑과 용서와 기도의
일을 조금씩 미루는 동안 세월은 저만치 비켜 가고. 사랑하는 이들도 한둘 떠나는 시린 세월을 사는 나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지천명할 세월이 훨씬 넘도록 살아왔지만,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 온다면 할 말이 없다.
그냥
바쁘게 살아온 것 외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아온 것이 대견스럽지만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빈 그림자에 매달려 부질없이 좇아온 것처럼 덧없고 허전하기만 하다.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 순간 한줄기 빈 바람이 스쳐간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내 얼굴 같지 않은 낯선 얼굴이며, 내 생각
같지 않은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차 어디론가 내닫고 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그리고 한 번뿐이라 반복할 수도 없음에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았다.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무언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음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기까지 시선에 담겼던 것들, 그 중에 무엇 하나 기억해 낼 수 없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보고 건성으로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앞만 보며 걸었다. 오로지 자기 갈 길만 부지런히 갈 뿐, 꽃이
피는지, 바람이 부는지 주변에 대한 관심도 도통 없었다.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려는지, 또 무엇 때문에 가려는지 알지도 못한 채. “속임수, 굴욕, 불신의 냄새를 풍기는 동전을 긁어 보아 더 큰 집, 더 좋은 승용차, 화려한 옷, 그리고
빛나는 보석으로 치장한 초상화는 과연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한
닢의 동전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귀한 것을 버려야 했는지 몰랐다. 모르고 버린, 그것이야말로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삶이 너무나 고단하여 가슴이 저릴 때마다 나는 두 눈을 감고 나만의
은밀한 ‘홀로’라는 신비의 세계로 들어간다.
유년의
기억은 그대로 남아
유년의
아름다운 그림 속으로, 볼이 터질 정도로 큰 알사탕 한 알에도 행복에 겨울 수 있었던 그 시절, 세월이 가도 마음속에 그대로인 집, 유년의 기억 속에 있는 집은
낡지 않고 그대로다.
장독대를 넘지 못하던 키 낮은 싸리 울타리, 하얀
무명 빨래를 너는 어머니의 등에 머무는 햇살, 부지런한 어머니의 등에서 보채다 잠든 어린 동생의 새근대는
숨소리, 햇볕이 따가운 오후의 꽃밭에 내려앉는 흰나비, 고무줄넘기를
하던 갈래 머리의 나,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개울 둑에 뿌리를 박은 도토리나무의 너른 그늘, 햇살이 하얗게 부서지는 초가지붕에 널려 있던 생선 생선들, 바닷바람에
묻어오던 향긋한 해초냄새,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고 엄마 아빠와 함께 횟감을 사려고 걸어가던 모래톱, 저 멀리 등불을 밝힌 고깃배에서 생선을 가르며 부르던 어부들의 타령조인 노랫소리, 밤하늘에 울려 퍼지던 그들의 노래가 왜 그렇게 어린 내 귀에 슬프게 들리던지,
살아서 퍼덕거리던 싱싱한 횟감인 물고기들의 비늘이 흔들거리는 등불에 반사되어 잘 연마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뽀빠이 아저씨의 팔처럼 근육질인 젊은 어부의 햇볕에 검게 탄 강인한 팔, 오랜
세월의 풍랑을 견뎌온 낡은 고깃배에는 색색의 깃발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횟감을 사 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거치적거리는 신을 벗어 손에 쥐고는 한낮의 땡볕에 데워져 따끈따끈한 모랫길을 맨발로 걸었다.
애호박
넣은 수제비 그리워
등불과
생선이 든 소쿠리를 들고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는 젊은 엄마 아빠와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고 발바닥을 간질이는 모래알을 비비적거리며 건드려
보기도 했다. 밤하늘에는 보석처럼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아름다운 밤하늘에 도취하여 목이 꺾이도록 해바라기 하면서 어지러워, 더는 목을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할머니의 옛날이야기에 나오던 방아를 찧고 있을 옥토끼를 찾아 헤맸다. 아버지와
겨루던 달리기와 멀리뛰기, 그때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잘 달리는 선수로 알았다.
그리고 때때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해서 슬펐다. 밤이면 셋집
단칸방에 어울리지 않는 화사한 색상의 비단 이불이, 어머니가 시집오실 때 해오신 것이 깔렸다. 그 예쁜 잠자리에 아빠, 아빠 팔에 내가 눕고, 그 옆에는 엄마, 이렇게 셋이 나란히 누워서 아빠가 들려주시는 옛날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나는 잠이 들곤 했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면 매번 나와 엄마의 자리가 바뀌어 있어
선잠에서 깬 나는 배신감에서 오는 지독한 가슴앓이(?)에 시달렸다.
엄마
아빠가 공모하여 나를 외톨이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아침마다 서러웠고 눈을 뜨면서부터 멈추지 않는 질긴 울음을 울어대곤 했다. 혼자 사시던 주인집 할머니가 자주 끓이시던 애호박 넣은 수제비, 나는
그 수제비가 먹고 싶어 내 몫의 밥을 퍼 들고 할머니의 어두컴컴한 좁은 부엌을 들랑거렸다.
외할머니
같았던 주인집 할머니를 나는 참 좋아했다. 할머니가 빚은 수제비는 엄마가 만든 것과는 다른 밀가루 반죽이
두꺼운 그래서 씹는 맛이 좋은 그런 투박한 것이었다. 엄마의 얇디 얇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이 좋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릇을 들고 수제비가 익기를 기다리는 나를 바라보며 앞니가 다 빠져 합죽해진
입매로 함박웃음을 짓던 할머니의 모습도 오늘은 그립다.
마음만은
늙지 않고 그대로
그리고
오래 잊고 있던 나의 노랫소리도 들려오는 우리 집 앞마당,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고 육신은 늙어가고
있어도 마음만은 늙지 않고 그대로다.
그래서 내 마음속과 기억 속의 이야기들은 늘 새 종이에 막 인쇄된
책의 갈피처럼 잘못하면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릴 수도 있을 만치 서슬이 퍼런 날이 샌 칼처럼 예리하게 젊다.
아득한
기억 속의 빛 바랜 사진 같은 추억의 조각을 맞추어 보며 나는 살아가야 할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짧다는 것을 육십의 문턱에 서서 비로소 새로운
사실인 듯 깨닫고는 가슴이 서늘하다. 내 후반기의 삶을 그려 가야 하는 숙제를 앞에 두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리고 매 순간 감동하며 살아가리라고 다짐한다.
영적
성장이 멈출 때 우리는 감동을 잃어버리고 마는데,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에
살아 있음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와 은총인지를 사위의 예기 하지 않았던 죽음 앞에 세워지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하루하루 처음 열리는 새로운 날들을 감격으로 맞이하여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꿈꾼다. 그리고 나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눈길을 주며 살고 싶다.
확실하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단 하나의 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사랑만 하며 살아서 행복해 지고 싶다. 주위를 돌아보니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도로변에 있는 소공원의 놀이터에 놀러 나온 아이들과 젊은 주부들의 모습이 밝아서 활기차
보인다. 일상이 가져다 주는 아픔이나 불화는 아랑곳없다는 듯이. 유모차를
밀며 지나가는 볼이 붉은 젊은 엄마는 얼굴 전체에 행복이 가득하다.
오늘, 이 순간까지 늘 내 삶에 작은 등불로 함께 해 주신 하나님, 길고
아득한 인생 여로의 대목마다 언제나 적당한 거리에 등불이 켜져 있었고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온 길이었다. 그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내 갈 길을 환히 비춰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