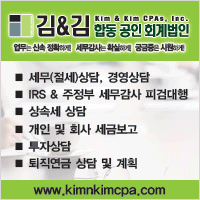안문자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희망의 주소
서울에서 온 우편물이다. Y목사님이 “80인생을 살아오면서,”
라는 부제가 달린 <췌장암을 경험한 이야기>라는 작은 책자를 보내오셨다.
성공한 40년 목회를 마치고 아름답게 은퇴한 Y 목사님은 절친한
대학 선배의 남편이다.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받고 슬프고 궁금했었는데 잘 이기고 계시다는 투병기다.
‘언제나 그리운 얼굴과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날 때까지 더욱 건강하세요,’ 라는 다정한 편지와 함께 따뜻한 성품이 담겨진 인자한 모습의 사진을 보니 왈칵 눈물이 난다.
진단 후 병원생활을 시작하며 나타난 증상들과 자세한 치료과정, 수술 후, 담당 의사들의 이야기,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을
위한 교인들의 중보기도,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퇴원 후의 항암치료 이야기들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
목사님은 발병 후, 놀람과 의아함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 하셨다. “나는 80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생활은 늘 규칙적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다고 자신했다. 몸과 마음이 50대인
줄 알았다.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이란 병이 찾아 왔다. 하마터면
우쭐대다가 더 큰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다.
80 고비를 넘기면서 더 겸손하게 인생을 받아드리며 살리라. 더
진실하게 삶을 가꾸며 살리라. 더 따뜻한 정을 주면서 살리라.”라고.
얼마 전, 한 친구에게서 이해인 시인의 <희망은 깨어 있네!>라는 시집을 받았다. 서문이 인상적이었다. 시인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아픔은 고통을
공부한 것이었고 치유의 기간은 “고통의 학교”에 다녔다고 썼다.
힘겨웠던 수련을 통해서 다시 보는 세상은
얼마나 감탄할 일이 많은지, 주위의 사람들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정겨웠는지 다시 깨달았다고 했다.
세상을 더 넓게 보는 여유, 힘든 중에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 이 세상에는 가슴 뛰는 일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고통의 학교”에서 다시 배웠다고 말했다.
병상에서 지은 시는 이슬처럼 아름다웠고, 치유 중의 일기는 들꽃보다
더 고와서 눈물겨웠다. Y 목사님도 이런 여유를 가지고 투병에 임하시기를 기도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책임질 아픔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고통의 몫이 있다. 시인은 투병생활을 “고통의 학교”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어디 병마와 싸우는 일뿐일까. 현실은 어둡다.
불확실한 세계 정세, 가치관의 혼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수 많은 장애물, 또 멀리, 가까이에서 질병과 죽음의 소식이 이어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지구촌과 맞닥뜨리는, “고통의 학교”와 같지 않을까.
Y 목사님은 자신 있던 삶 속에서 뜻밖에 나타난 암의 발견은
하나님의 ‘경고’(Attention)라고 고백하셨다. 나는
잠시 글쓰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에게도 수많은 경고가 있었을 텐데, 불평만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며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두 손을 모은다.
결국, 2018년 1월1일,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라는
메일을 받았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Y 목사님, 애틋한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셨다.
나이를 먹는 것은 이별을 위한 준비라고 하지만 이런 소식이 올 적마다 두렵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땐 한 동안 몸살을 앓듯 슬프고 고통스럽다가도 흐르는 세월 따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잊어간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서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는 이별은
가슴에 이는 아픔이다. 잊어감이 죄스럽고 슬프지만 이별을 생각하고 싶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게다.
시애틀의 겨울이 거칠게 심술을 부린다. 비 오다 개이고, 추워서 움츠렸다간 봄날 같이 따뜻해진다. 그 틈에 독감 바이러스는
세상이 좁다는 듯 퍼져가며 괴롭힌다.
그러나 제 아무리 발버둥쳐도 머지않아 살랑대며 다가오는 봄바람엔
별수 없을 터. 결국엔 말썽쟁이 겨울도 수녀님의 시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희망이란다.”를 외치며 손을 들고 물러가겠지. 아지랑이
고인 굳은 땅 속에선 여린 싹들이 어둡고 차가운 고통을 헤치고 희망을 안고 올라오고 있을 거야. 희망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부르고 깨워야 한다고 하지 않던가.
절망뿐인 것 같은 세상을 위하여
새싹들은 잠자는 희망을 깨우러 오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돋아난 어린 싹들이 고개를 들고 세상을
향해 속삭인다. ‘괜찮아요. 용기를 가지세요. 봄은 역경을 이긴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찾아온답니다. 우리가 희망을
깨우러 왔어요.“ 웃으며 손짓한다.
뛰고 있는 나의 가슴에도, 비통함에 잠겨있는 선배의 가슴에도. 알고 있지요? 인생의 희망은 늘 괴로운 언덕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 빛나고 있는 Y 목사님의 후손들에게, 절망에서 일어서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 줄테지요.
고맙다고, 잘 견뎌 주었다고 속삭여 줄 거예요. 아, 연두 빛 새싹들이 어둠을 뚫고나와 희망을 깨운다. 향긋한 봄바람도
두 팔 벌려 합세한다. 은실, 금실 봄비가 희망이 오는 길을
밝게, 맑게 닦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