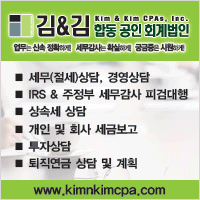공순해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회장)
구글 맵
상전벽해란 말도 구태의연해졌다.
이젠 고어 사전 속으로
사라져야 할 낱말 중 하나가 아닐지. 얼마 전엔 책상에 앉은 채로 부모님 묘소엘 다녀왔다. 재미 삼아 구글 맵에서 위성 사진으로 한국의 고향을 클릭했다.
마을이
나타났다. 확대 버튼을 눌렀다. 버튼을 누를수록 마을이 크게
드러났다. 최대치로 올리자 마을 뒷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놀라움으로
목울대가 움직이는 순간 눈은 사진에 빨려들 듯 고정됐다.
당숙들, 백부님
중부님 내외분, 그 아래로 부모님 묘소가 확실하게 보였다. 치밀어
오르는 뜨거움을 누르며 눈으로 상석 앞에 제물을 진설했다. 막걸리도 따르고 절도 했다. 풀도 뽑았다.
성묘(?)가 끝나자 이곳저곳 클릭해 근처 조상님들의 묘택도
둘러본 뒤, 내친김에 마을 스트리트 뷰를 눌렀다. 고향 마을
안길이 나타났다. 길을 클릭하며 따라가 봤다. 길은 큰댁
앞마당에서 더 이상 나가질 않았다. 한데 놀라운 일은 그 길에서 식별되는 것이 큰댁 대문뿐이었단 사실이다.
멀리 솟은 만장봉의 위용은 그대로인데, 당숙들의 댁도 삼종숙들의
댁도 달라져 기억 속의 골목은 전혀 딴 세상이었다.
아끼고 아끼며 보듬던 구슬목걸이 끈이 끊어져 흩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긴 모두
고향을 떠났다. 돌아가신 분들만 선산에 남아 계실 뿐, 산
자들은 이미 고향의 거주자들이 아니다.
며칠 뒤 혹시 하는 심사로 떠나온 뉴욕 브루클린 남쪽 바닷가, 살던
곳을 검색해 봤다. 마고 선녀의 말처럼 상전벽해가 되다 못해, 변한
바다가 다시 뽕나무밭이 된 서울과 달리 그곳의 모습은 떠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었다.
닉의 앞마당, 프레드릭의 안마당, 심지어 조우는 제집 현관에 앉아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잡혔다. 앤과 아이리스의 집도 깔끔한 모녀 닮아 여전히 깨끗한 외관이었다. 달라졌다면 거주민이 달라졌을 뿐. 샤핑몰 간판이 온통 한자 간체투성이다. 과거 골목마다 들어선 그로서리 가게는 한국인들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인들이
모두 점령해 버렸는가 보다.
이사한 처음 거기는 이탈리언 주거 지역이었다. 거주민 5%가 흑인, 15%가 동양인일 뿐이었다. 이탈리언 주거지다 보니 마피아들의 저택이 즐비했고, 동양인에게 집
팔지 말자는 벽보가 나붙기도 했다.
하지만 밀려드는 변화엔 그들도 어쩌는 수 없었다. 이탈리언 여고생 친구의 생일 파티에 흑인 남자 고교생이 찾아왔다 총 맞고 절명한 사건 이후로 변화는 급속도로
일어났다.
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싶어, 버티는 그들에 맞서
차별에 항의하는 흑인들의 연일 데모로 해서 많은 이웃이 떠났다. 그 빈 자리를 러시안 쥬이시들이 밀고
들어왔고 뒤이어 중국인들이 들어왔다.
이탈리언들을 떠나게 만든 흑인들은 그러나 맨해튼으로 통하는 오션
파크웨이를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인구의 지각 변동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멜팅 팟, 샐러드 보울이란 그 고장 별칭답게 인종의 혼합과 변화가 위성사진에서도 여실히 보였다.
한국과 뉴욕의 변화는 대비를 느끼게 한다. 한국에 다녀온
사람이면 누구나 혼란스러워한다. 건물도 길도 바뀌어 심지어 살았던 곳조차 흔적이 없어 찾을 길이 없다고.
변화의 기간은 4, 5년 정도? 건물의
수명 기간이 3, 4십년 정도니 재건축이 흔하고 애초 계획된 도시가 아니었기에 지을 때마다 길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데 건물과 길이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달라지는 셈이다.
뉴욕의 경우엔 태어난 집에서 눌러 살고 거기서 자녀 결혼시키고 은퇴도 하기에 주택이 달라질 일이 별로
없다. 단지 상가의 경우 세계 도처에서 밀려드는 이민자들로 해서 비즈니스는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건물 수명이 백 년을 훌쩍 넘기기에 건물과 길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시 당국에선 백 년 넘는 건물의 경우 랜드마크의 보존이라고 보호 정책까지 편다. 하기에 이런 건물의 경우 매매하거나 업종 변경을 하려면 시 당국의 허가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건물과 길은 변화가 없는데 거주민만이 달라지는 셈이다.
앉은 자리에서 이런 변화를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앞으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를 남길까. 자못 흥미롭다.
하지만 겁도 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빅 데이터가
낱낱이 기록으로 저장해 나중에 어떤 변화로 돌려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에. 빅 데이터를 쥔 사람들이
영주(領主)가 되고 나머지는 농노(農奴)가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하면 우리는 19세기 농노들처럼 저항 운동을 벌여야 할까.
상전벽해의 변화를 즐겨야 할지, 빅 브러더를 두려워해야 할지, 사는 게 난감한 일임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