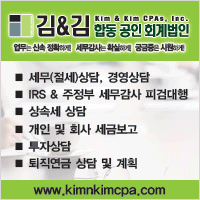이한칠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회원)
눈 오는 날의 시애틀
큰일이 벌어졌다. 식품점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차들이 길 위에 늘어서 있다. 나도 일찌감치 퇴근했다. 오랜만에 오는 순백의 손님을 맞이하려는
시애틀 풍경이다.
시애틀 겨울 하늘은 회색이다. 조금 힘없어 보이지만, 무던해서 편안하다. 그런 하늘빛을 머금은 빌딩 유리창과 호수 물빛도 온통 재색이다. 잿빛
하늘이 꺼뭇한 구름을 만나면, 영락없이 비를 흘린다. 대개
실비나 가랑비를 부슬부슬 뿌리지만, 때때로 발비를 쏟기도 한다. 시애틀
사람들은 겨울비를 우산 대신 온몸으로 받아준다. 그래서 일까. 비는
시나브로 친구가 되지만, 눈은 친근하지 않다.
이따금 눈이 온다. 낯선 사람처럼 어색하다. 눈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어 들려는 순간도
잠시이다. 눈이 오기도 전에, 너나 할 것 없이 안전을 염려하며
난리를 친다. 먹거리를 사거나 차에 기름을 채우느라 북새통이다. 직장이나
학교는 문을 닫기도 한다.
눈이 오면 시애틀에선 밖에 나갈
엄두를 내지 않는다. 미끄러지는 순간, 무릎이 소리라도 지를까
염려된다. 촌스러운 걱정이 나이 탓만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대부분 집에 머문다. 용 빼는 재주가 없으니, 나도 그들처럼
꼼짝없이 눈에 갇힌다.
펑펑 쏟아지는 눈 속에서 나는 첫눈의
추억을 보았다. 첫눈이 오면 으레 누구를 만나야 할 것 같았다. 따끈한
커피라도 함께 마셔야 했다. 손을 꼭 잡고 눈을 밟으며 걸어야 하는 줄 알았다.
교외선이 있던 시절, 서울에서 가까운 송추의 눈길은 호젓했다. 젊은 날 첫눈의 추억은 그리움이다. 그때로 돌아가 볼까.
“눈길을 걸어 볼래?”.
“어유, 넘어졌다 하면 뼈 뿌러져요.”
뼈와 뿌, 잇따라 된소리를 들으니 내 귀가 놀랐다. 그 옛날, 눈길을 함께 걸었던 아가씨가 맞나, 아내를 쳐다보았다. 아, 낭만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그 표정이 그지없이 자연스럽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눈은 변함없이 새하얗다. 그렇다. 눈이 그대로인 것처럼 아내도 나도 변한 건 없다. 세월만 저 만치에서
이만치로 와 있을 뿐이다.
앞집 지붕 위에 흰 눈이 높다랗다. 산에는 얼마나 많은 눈이 쌓였을까. 시애틀 근교의 겨울 산행은 눈과
함께하면 제 맛이다. 오늘도 눈신산행을 할 예정이었지만 폭설로 포기했다. 어제 저녁에 꾸려 놓은 배낭과 눈 신이 현관 앞에서 안달한다.
아내가 분주하다. 취소된 눈신산행이 나만큼 아쉬웠나 보다. 등산 스틱과 크렘폰을 건네
주며, 이번에는 아내가 말했다. ‘나가서 눈 위를 걸어 볼까요?’. 넘어지면 뼈 부러진다는 말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하얀 동네를 크게 한 바퀴 돌았다. 소복이 쌓인 숫눈에 폭폭 빠지며
걷는 느낌이 쏠쏠했다. 이래저래 총천연색이었던 내 마음도 하얘진 것 같았다. 슬며시 옛 추억도 맛보았다.
적은 양의 눈에도 시애틀은 예민하다. 야단스럽다고 여겼는데, 이유가 있다. 언덕바지가 많다. 눈이 가끔 내리니, 동부 지역처럼 도로 정비가 쉽지 않나 보다.
폭설로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긴다.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초대장까지 이미 발송했지만, 눈 때문에 행사를 연기했다. 벌어진 일을 주섬주섬 정리했다. 얼어붙은 눈이 얼른 녹기를 바라지만, 마음 한구석엔 하얗게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눈이 내린다. 엊그제 핀 매화는 별일 없을까. 뒤뜰로 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생생하게 핀 매화에 눈꽃이 피었다. 덮인 눈 사이로 고개를 내민 분홍 꽃봉오리가 참하다. 눈발이 날려
내 뺨을 스친다. 차갑다. 이리 찬 눈 속에서 저리 버티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눈 속에 피는 꽃, 설중매의 앙증맞은
자태를 담아내고 싶어 셔터를 눌렀다. 옹골찬 맵시가 대견하다.
설중매는 눈 속에서 따뜻한 봄을
기다린다. 어려운 일을 인내하노라면, 희망이 찾아온다는 삶의
순리를 보여준다. 시애틀의 긴 우기, 덤으로 푸짐하게 받은
하얀 눈 속에서 나도 봄을 기다린다.
뽀드득뽀드득, 새봄을 향해 눈길을 조심조심 내디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