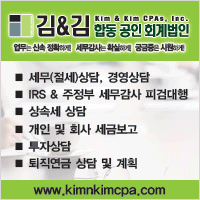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의문은 곧 나의 글쓰기로 이어진다.
미국인들이 하는 질문은 때로는 유치할 수도 있지만 나로 하여금 기초적 이해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왜 한국인의 높임말에 ‘자다’는 ‘주무시다’가 되고, ‘먹다’는 ‘드시다/드세요’가 되는지 궁금하단다. 많은 선생님들도 금방 답이 떠오르지 않는 질문이다.
‘자(ㅈ⦁)다’의 명사형은 ‘잠’이다. ‘잠’에서 모음 변이를 일으키면 ‘줌’이 될 수 있다.
이는 물(水)에서 모음 변이를 일으키면 ‘밥에 물 말다’가 된다. ‘ㅈ⦁ㅁ⦁ㄹ쇠(이하 ⦁는 아래 아)’가 자물쇠, ‘ㅊ⦁다’에서 ‘칩다/춥다’, ‘ㅈ⦁ㄹ⦁’가 자루(柄), ‘아ㅁ⦁것’이 ‘아무것’, ‘나ㅁ⦁라다’가 ‘나무라다’, ‘모다(몽땅)’가 ‘모두’, ‘난호다’가 ‘나누다’, 얼마든지 ㅜ 모음 변이의 예를 들 수 있다.
‘자다’에서 ‘잠’이, 그리고 ‘줌’으로 되고 다시 ‘주무시다’란 말이 만들어진다. 더 나아가 자다는 ‘졸다’를 만든다. 아주 조용하면 (잠)자는 상태가 잠잠하게 이르게 된다. 이런 종류의 예들은 ‘발(足)’에서 발로 도망치는 ‘발르다’, ‘다리(脚)’에서 다리로 뛰는 ‘달리다’의 파생어를 들 수 있다. 배(服)는 배다(孕)를 ‘목이 타다/마르다’는 ‘먹다(食)’를 만들어낸다. 물 한 먹음은 물 한 모금이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면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멱’은 ‘목’의 옛말이다. 돼지 멱따는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다. 멱살은 목덜미를 잡는 행위가 된다. 목숨에서 ‘숨의 쉬다와, 줌(주먹/주머니)의 쥐다’ 말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왜 ‘먹다’는 ‘먹으세요’가 아닌 ‘드세요’가 되는지.
먹으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수저를 들어(擧) 입에 넣으라는, 아니면 손으로 잡으라는(執 ) 간접적인 표현을 옛사람들은 유화적으로 점잖게 써왔다. 이런 예들은 ‘죽다’가 ‘돌아가시다/수저를 놓으셨다, 또는 주무시고 계시다/깊은 잠을 자고 있다’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한국어를 대하는 미국인들에게 나는 아직도 ‘먹으시다/먹으세요, 자시다/자세요’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나서 한국어를 이해하고 나면 ‘드세요/잡수세요, 주무세요’를 가르친다. 왜냐하면 1차적 말은 2차적인 간접적인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앞서기 때문이다. 아직도 엄마들은 어린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먹으세요, 자세요’란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 현실상 버릴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주무시다, 잡수시다’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잡수다' 자체가 높임말이지만, 다시 높임선어말어미 '-시-'를 붙여 높여 ‘잡+수(삽)+시다’ 로 풀이가 된다. ‘줌+우+시다’의 유추가 가능하다. 즉 ‘-우시다’가 자연스럽게 이해될 줄 믿는다. 주무세요, 잡수세요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