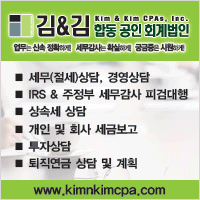이 에스더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회원)
동 행
오랜만에 하늘이 맑다.
겨울 햇살이 내려와 뒷마당 과수원에 서있는 나무들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다. 제 몫의 삶을 감당해낸 나무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인 듯하다.
햇살의 손길을 따라 가던 눈길이 나무의 밑동에 머문다. 밑동쯤에 나무를 꼭 붙들고 있는 그림자가 보인다. 한입 베어 물면 단물 뚝뚝 흘리며 녹아들던 빨간 자두 맛에 감동하던 날에도, 입 안 가득 퍼지던 사과 향으로 마음까지 상큼해지던 가을날에도 보이지 않았던 그림자가 차가운 겨울이 되어서야 눈에 들어온다. 나무는 그림자와 함께 계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것을 왜 일찍이 깨우치지 못했을까.
한 장의 사진이 떠오른다. 지난 봄 튤립 축제에 다녀온 친구가 보내온 것이다. 오래 전에 가 보았던 그 곳, 튤립과 수선화가 끝없이 펼쳐진 마운트 버논의 들판을 그리며, 친구 덕에 가만히 앉아서 꽃구경을 하려니 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사진 속에는 꽃이 없었다. 얼핏 보기엔 뚜렷한 모양조차 드러나지 않는 수묵화처럼 보였다. 자세히 보니, 튤립의 민낯이 오롯이 담긴 사진이었다. 거대한 꽃물결이 넘실대는 들판에서 그녀는 밭이랑에 누워 있는 꽃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진 속에 곱게 담아둔 친구.
그녀의 깊은 눈길을 빌어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림자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림자 꽃에서 그녀의 잔잔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그림자 밟기를 하며 놀았다. 아이들은 그림자를 잡으려고 쫓아가고, 잡히지 않으려고 내달렸다. 태양이 그리는 커다란 그림자 시계 속에서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시계 바늘에 매달려 함께 돌았다. 석양녘에는 내 키보다 훨씬 큰 그림자가 따라다녔고, 겨울이 되면 여름보다 긴 그림자가 붙어 다녔다.
겨울 밤이면, 빛이 어둠 속에서 불러낸 그림자들과 놀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백열전구 아래서 두 손을 모아 손가락을 움직이면 벽에 나비가 날고 개가 컹컹 짖어대는가 하면, 오리가 긴 목을 빼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그림자놀이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세상의 이치를 어렴풋이 깨우쳤던 것 같다.
어느 밤길에서 마주친 내 그림자가 무서워서 있는 힘을 다해 골목길을 뛰어나왔던 적이 있다. 떨어져 나간 줄 알았던 그림자를 큰 길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그림자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기억이 생생하다. 그림자는 결코 떼어낼 수 없으며, 내가 드리운 그림자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돌이켜 보면, 그림자 속에 애써 감춰두고 싶었던 삶의 조각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었다. 때론 나를 짓누르며 아픔을 주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몫이었다.
그림자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 그림자는 코 끝에 호흡이 붙어 있다는 증거일터.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세상의 숨 탄 모든 것들은 제 그림자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가. 그림자를 애써 떼어내려 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그림자가 자라면 그늘을 이루고 그 품에 생명이 깃드는 것을.
겨우 내 추위를 이겨낸 그림자라야 뜨거운 여름날 서늘한 그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리라.
며칠 동안 겨울비에 씻긴 그림자가 성큼 다가와 곁에 선다. 내 그림자가 반갑다. 따뜻한 가슴 한켠을 그림자에게 내어주며 온기를 나누고 싶다.
숨결이 느껴지는 그림자를 벗 삼아 노을 고운 지평선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싶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내 가는 길 어딘가에 작은 그늘 드리워진 쉼터 하나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살아 있는 것들을 위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누구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감사할 일 아닌가.
겨울 햇살이 맑은 날, 모처럼 내 그림자를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