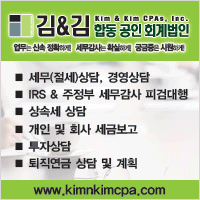김윤선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고문)
발
사용설명서
나는
지금 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다. 일 년에 딱 한 번, 이
즈음이다. 목선이 파지고 잠자리 날개 같은 민소매의 원피스에 눈이 갈 때, 맨발이 어색하지 않은 때이다. 그런데 샌들 사이로 드러난 다섯 발가락이
민망해서 살짝 옷을 입히고 있다.
무딘
솜씨라 섬세하지 못하다. 그런데 뜻밖의 것에 눈이 뜨인다. 두
발이 한 몸에 붙어있는데도 삶의 이력이 판이하다. 왼발보다 오른발이 거칠다. 오른쪽 엄지 발톱에 무좀의 흔적이 있어 애초에 왼발의 품격에 비길 바가 못된다.
게다가 이십 년도 더 오래 전에 오른쪽 발목을 삐었는데 가시지 않은 부기 때문에 지금도 발등이 도드라져 있다. 겨울철에 기온이 뚝 떨어지거나 날궂이를 할 때면 영락없이 티를 낸다.
인체의
부위를 두고 중요도를 따질까마는 발도 턱없이 내게 헌신하는 부위다. 따지고 보면 하루의 일과는 발이
땅에 닿으면서 시작하고, 발이 자리에 눕는 때 끝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듯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다.
죽는 날까지 잃고 싶지 않은 가장 소중한 것을 대라면 서슴지
않고 보행의 자유를 대겠다고 한 박완서 작가의 말이 아니어도 사람이 어딘가 떠날 수 있는 건 건강한 발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탈출을 꿈꾸는 로마의 노예들이나 미국의 흑인 노예들에게 발에 쇠고랑부터 채웠던
게.
나는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꽤 오랫동안 절룩이면서 걸었다. 그러다보니 걸을 때는 물론이고 서 있을 때도
은연중에 왼발에 힘이 들어가는 게 습관이 됐다. 그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이번에는 왼쪽 발목에
무리가 왔다.
둘씩 있는 인체 부위는 그것을 공평하게 쓰라는 것이지 여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인체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유형의 도구다. 욕심 부리지 마라, 아껴 쓰라, 존중하라.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듯 삶의 진리 또한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우연히
시어머니의 발을 보게 됐다. 젊어서부터 발의 모양새가 밉상이라며 집안에서도 꼭 양말을 신으셨는데 과연
그랬다. 엄지발가락 아래 뼈가 유달리 도드라져 있었다. 저런
발로 세상을 헤집고 다니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키우셨구나, 생각하니 고부갈등이 한순간에 씻겨 내리는
듯했다.
그런데 앞이 뾰족한 하이힐에 맞추느라 굳은살이 붙은 내 발도 밉상이기는 마찬가지다. 종아리를 당기고 허리를 곧추세우며 키를 부풀려 자존감을 높여주던 하이힐을 과용한 대가다. 그러고 보면 그날의 낙상은 발에게 휴식년을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싶다.
새로운 생활에 막 진입하려 할 즈음이었으니 편한 신으로 더 많이 움직이며 살라는 메시지였는지 모르겠다.
아기가
태어나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충 일 년이다. 배밀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기어 다니다가 일어서면 마침내 사람 꼴을 갖춘다. 아장아장 걷는 걸음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기른다. 달음박질로 바뀌면
제가 살아갈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말한다.
가장 빨리 걷고 가장 오래 뛸 수 있는 때가 젊음의
절정이다. 노인이 된다는 건 그런 움직임을 잃어가는 과정이며, 죽음이란
그런 움직임을 영원히 멈추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땅에 발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던 날, 삶의 책임을 다하셨다는 기별이었는지 모르겠다.
요즘
들어서 예전 같지 않은 정신과 육체가 때때로 삶을 허기지게 한다. 도무지 일으킬 수 없는 삶의 열정과
의욕, 늘 그 나물에 그 밥인 듯한 일상이 언제부터 계속돼 왔는지 모르겠다. 언제 꼭 한 번 하리라 마음속에 쟁여 놓았던 소망은 시간이 넘쳐나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아서라, 내 힘이 못 미치는 현실의 벽 아니던가.
이때쯤 세상 바라보는 눈을 발의 높이에 두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실
불교에서의 절은 발과 머리를 같은 높이에 두는 일이다. 발의 높이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깨치라는 뜻일 게다. 세상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들이 배운 남다른 것이 삶에 대한 무한한 겸허함이고
보면, 그건 발끝까지 내려간 낮아진 눈높이 때문이 아닐까.
친구들이
단체로 라인댄스를 배우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펭귄들이
궁둥이 튕기는 날이라나. 다들 하이힐에서 단화로 바꿔 신는 이즈음이라 상상만으로도 짐작이 간다. 발의 사용설명서가 강조되는 이때, 머리와 발이 따로 노는 춤은 감동이다. 단톡방에서 전해주는 음률이 생생하다.
“원, 투, 쓰리, 포, 싸랑해선 안 될 싸라믈, 싸랑하는 죄이라서, 아싸!”
무딘
발놀림이 바쁘다. 살아 있다는 표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