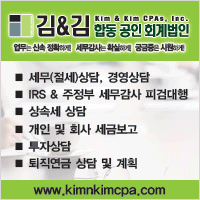공순해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회원)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이 땅에 발을 내디뎠던 처음, 자리 잡은 곳은 브루클린 남쪽 바닷가 배쓰 비치였다. 뉴욕 한인
사회에선 통칭 벤슨허스트라 부르던 곳.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백인80% 아시아인 15% 흑인 5%인 곳이었다. 백인은 스페니쉬를 포함한 숫자였다.
어느 날 86가 가게에 눈이 예쁜 어린아이가 걸어 들어왔다. 하이!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아이가 사랑스러워 나도, 하이! 답해 주며 뭘 사러 온 아이일까 도와주려 했다. 순간 누군가 내
등을 쳤다. 정신 차려! 애에 정신 팔려 멍청하게 애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 남편이었다. 남편은 무서운 얼굴로 나를
나무라며 집시 어른의 가방을 낚아챘다. 이미 그녀의 가방엔 그로서리 몇 개가 들어가 있은 뒤였다. 아이를 앞세워 내 눈을 홀린 뒤 일을 저지르다니.
판매 이익을 산출할 때 이익의 10%를 손실액으로 잡았는데 그 대부분은 실물(失物)이었다. 기승부리는 도둑 중엔 2리터
소다를 가랑이에 끼고 가는 자도 있었다. 가게에서 일하며 가장 힘든 일은 도둑 지키는 일이었다. 심리적 갈등이 컸다. 그것도 몇 달 해보니 요령이 늘어 손님이 문에
들어서는 순간 어느 정도 식별이 됐다. 문제가 생길 관상이면 정해둔 암호로 안에 대고 신호를 줬다. 하면 골목마다 직원들이 퍼져 대상을 관찰했다. 가게 곳곳에 걸린
거울들이 유용하게 쓰였다.
거기 갔던 첫해에 아이를 낳은 이탈리언
여자 손님이 있었다. 그녀의 산달을 같이 기다렸고, 아이가
태어난 뒤 기뻐해 주었으며, 그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매일의 즐거움으로 바라봤다. 나와 함께 영어 신생아였던 아이가 말문이 터지고 날로 말이 늘어갔다. 넌
이렇게 영어가 느는데 난 언제 영어가 느냐. 내 말에 아이 엄마도 함께 웃었다.
그러던 한 날 직원이 1파운드 밀가루를 훔친 도둑이라고 아이 엄마를
내 앞으로 데려왔다. 거의 매일 샤핑하는 양으로 보아 배고픈 사람도 아닌데… 후미진 구석에서 치마 안에 넣었다고 직원은 말했다. 실색(失色)이 된 내게 남편이 다짐을 뒀다. 이젠 다시 아이들에게 관심 갖지 마. 그 속뜻은 사람에게 마음 주지
마, 아니었을지.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어제 일어난
흑인 폭행 기사를 읽으며 저절로 생각은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은 할인점에서 인형 절도
혐의를 받은 네 살짜리 여아의 부모가 경찰로부터 거친 대접을 받고, 시와 경찰서에 1천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관할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의하면 경찰이 다가와 아이 부모에게 총을 겨누고 위협하며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임신 중인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었음에도 경찰은 안전을 무시하고 부부에게 수갑을 채웠고 소란을 내다보던
이웃이 이 과정을 찍어 동영상을 공개해 현장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이 사건이 극으로 치달아
흑백 갈등의 양상으로 발전될까 염려스럽다.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키웠을까. 그 할인점에선 꼭 경찰을 불렀어야만 했을까. 학교 옆에서 가게 하던
시절, 아침 장사하던 중 한 학생에게 줄서기를 요구하자 계산대 옆에 진열한 물건들을 집어 던져 망가뜨렸다. 그 아이의 감정의 증폭은 순식간이었다.
절도의 경우는 물건을 회수하면
그만이지만 이런 폭력은 경찰 소관이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우리에게 설명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학생을 체포하는 일뿐이라고,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단다. 우리는 선도(善導)를 원했기에 경찰은 그냥 돌아갔다. 학생을 보내고 바로 뒤 선생이
물건을 사러왔다.
우리 설명을 들은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다. 범죄 성향을 방치하면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을 해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그것을 예방해야 하므로 꼭 처벌해 고치도록 하던가, 일찌감치
범죄자로 분류해 일반으로부터 격리하든가 해야 한다고, 눈감아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정색하며 우리를 나무랐다. 미국식 교육엔 선도가 없다.
그야말로 한국식과 미국식의 차이였다. 만일 그 할인점에서 4살 여아의 절도를 물건만 회수하고 끝냈었다면
어땠을까. 미국과 한국 사이에 중간 지점이 없듯 미국엔 범죄와 처벌 사이에 중간 지점이 없다.
내 경험에 의하면 흑인만 절도죄를
범하는 건 아니다. 백인도 똑같다. 86가 시절, 손실액을 줄여보려고 온갖 대처 방법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웃으로
교감을 나누다가도 어느 순간 얼굴을 바꾸는 사람들. 수없는 실망을 겪으며 마음의 상처 부위가 갑각류처럼
두꺼워졌던 시절, 사고방식의 차이를 극복하긴 어려웠다. 이렇게
다른 채, 그러나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다.
<서북미 문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