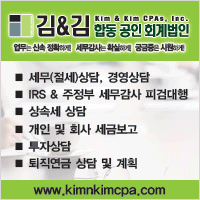힘차게 그리고 즐겁게 달려온 오레곤 코스트 길의 끝이 보인다. 어느덧 달리다보니 오레곤 끝이다. 다양한 모습으로 보는 이를 즐겁게 해주던 오레곤의 다양한 풍광들이 꿈처럼 스쳐지나간듯 하다.
Cape Blanco등대를 끝으로 오레곤 끝 도시인 Brooking 까지는 특별하게 눈에 띠는 그리고 이름 있는 명소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렇듯이 오레곤 끝까지 펼쳐진 바다 풍경은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절경의 연속이다. 도로 자체가 해안과 맞닿아 달리는 이곳은 여행의 피로를 덜어주기에 충분한 코스다.
오레곤 남쪽 해안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골드 비치가 오레곤 해안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름이 골드 비치인 이유는 모른다. 과거에 금이 많이 나온 곳인지 아님 워싱턴주의 루비 비치처럼 석양이나 일출때 보이는 바닷가의 풍경이 금처럼 바짝 거리는지 모를 일이다.(금이 많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아무튼 이름 자체가 골드 비치라고 되어있어 눈길을 끌기는 충분한 이름이다.
골드 비치의 입구도 여느 도시와 다를봐가 없다. 미국 서부 해안의 대부분의 해안 도시와 비슷한 분위기다. 작은 다운타운을 빠져 나가면서 오른쪽 차창으로 보이는 해안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해안과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이 해안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해안으로 내려가 보자. 모래 결이 유난히 곱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주 오래전 이곳을 처음 지나면서 해안분위기에 반해 카메라를 들고 해안으로 내려갔다. 고운 모래와 예쁜 돌들이 나를 끌어 들였다. 카메라 앵글을 낮게 하고 촬영하느라 모래 바닥에 업들 이는 순간 심한 바람에 모래가 날려 온몸을 때렸다. 카메라에 모래가 들어가는 건 당연 했고 사정이 없이 때리는 모래바람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기억이 진 한곳이다. 그런데 그날만 그랬던 건 아니다. 갈 때마다 그랬다. 강한 바람도 아닌데 낮게 깔려 부는 바람이 모래들을 이동 시킨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을 가보았지만 바람과 모래 바람은 여전했다. 아무튼 처음 느꼈던 그 기분 지금도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다.
오레곤 아스토리아에서 Brookings까지 대략 340마일 정도의 짧지 않은 길이다. 오레곤 최남단은 Brookings이다. 도시 규모가 제법 크다. 캘리포니아와 맞닿아 있는 오레곤 마지막 남쪽 도시다. 이곳을 지나면 캘리포니아다. 그리고 US101도 해안 도로를 벗어나 내륙으로 들어간다. 들어가기 전에 아쉬움을 달래듯 해안 풍경의 절정을 보여준다. 물론 지금까지 보아온 오레곤주 해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래도 장소마다 느끼는 기분은 다르니 뭔가가 있긴 한 듯하다.
한마디로 오레곤 해안이 워싱턴주와 크게 다른 것은 해안에 거대한 바위섬이 많다는 점이다.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해서 해안의 분위기를 한 것 살려주는 모양새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1번 도로를 극찬을 한다. 해안풍경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이 캘리포니아 1번 도로라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 캘리포니아 해안도로도 정말 기가 막힌 곳임엔 틀림없다. 그런데 난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 해안도로보단 오레곤 해안이 더 좋아 보인다. 캘리포니아 해안은 광활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넓고 웅장하다는 표현을 써도 손색이 없는 태평양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러나 오레곤 해안은 같은 태평양이지만 캘리포니아보다는 웅장함은 덜하다. 다양한 모양의 바위섬들이 해안의 분위기를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표현을 해준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보여준다. 해안의 진수를 쉬지 않고 보여주는 열정에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이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