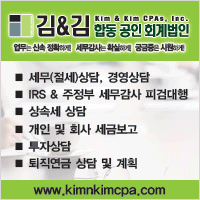염미숙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회원)
바람의 흔적*
두 해 만에 레이니어 산에 올랐다.
파라다이스가 얼마 남지 않은 지점, 나라다 폭포의 주차장에서 시원한 소리를 내며 서둘러 길 떠나는 물줄기를 만났다. 부지런히 달리듯 흐르던 물은 돌다리 아래 맑게 고인 듯 머물다 다시 가파른 선을 그리며 하얗게 절벽 아래로
부서져 내렸다.
계곡 옆에는 전나무 몇 그루가 하늘로 곧게 솟아올랐다. 산새 한 마리 포르르 날아와 높은 가지
끝에 앉았다. 순간 새가 앉은 높은 가지들이 모두 한 쪽 방향으로 뻗어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대한 레이니어 봉우리를 힘겹게 넘은 바람이 마침내 비를 내려놓은 가벼워진 몸으로 산 아래로 향할 때 이 계곡을
매섭게 휩쓸고 지나갔나 보다. 나지막한 나무와 수풀들은 산 아래나 이곳이나 다를 바 없지만, 키 큰 전나무들은 날 선 바람의 공격을 한 몸에 받았다.
파라다이스에서 내려오는 길, 딸아이가 가파른 길에서 허리를 젖히고 걷기가 힘들었나 보다. 뛰어가는 것이 낫겠다며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만 뛰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어 앞서가던 아빠를 지나쳤다. “아빠! 저 좀 잡아줘요!” 아이가 외치는 순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바로 가속도가 붙은
바람의 하산이었다.
전나무의 가지는 떠나가는 바람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먹을 잔뜩 머금은 붓이 힘차게 뻗어
하늘에 매몰찬 바람의 행적을 그려 넣었다. 과연 전나무들은 주변 나무 중에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의연하고 수려한 자태를 가졌다. 나무의 영광은 오랜 세월의 고통을 잊을 만한 보상이다.
질그릇에 유약을 바르고 불구덩이 속에 넣는다. 그릇은 뜨거운 불을 견딘다. 자유로운 불의 붓으로 새겨지는 문양.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고통을 거절한다면 윤기 없고 깨지기 쉬운 토기로 남아야 할 것이다. 질그릇은
오랜 불을 견디어 마침내 찬란한 빛과 독특한 문양을 가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도자기로 태어나게
된다. 고통은 그 고통을 잊을 만한 넉넉한 보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애리조나 주의
사막에서 과학자들은 나무의 성장에 관한 실험을 했다. 삼 에이커의 바람이 불지 않는 투명 공간을 짓고 그 안에 나무들을 심었다. 나무들은 정상보다
빠르게 자랐으나,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갑자기 쓰러져 버렸다고 한다. 바람의 압박은 나무가 깊이 뿌리내리고 자라는데 필수조건이다. 결국,
바람이 나무를 살린다는 역설이다.
지난 가을 헤더 레이크로 등산을 갔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산등성이로 오른 지 십여 분쯤 되었을까? 큰 전나무가 쓰러져 막혀버린 등산로를 간신히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것이 보였다.
가만히 보니 사람의 등에 도드라진 척추 뼈처럼 산의 등을 따라 올라가며 바람이 지나간 자리가 보였다. 바람의 길을 따라 나무들이 줄지어 넘어져 있었다. 그제야 얼마 전
강풍 주의보가 왔었다는 것을, 그리고 웨지우드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위에 커다란 물푸레나무가 뿌리를
내놓고 누워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이 숲에 있었다면 휘두르는 바람의 칼날 앞에서 숨이 막히지
않았을까?
고통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의 어쩔 수 없음을 깨닫는 것. 내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구덩이 속으로 예고 없이 던져지는 것. 차례로 고목들을 무너뜨리고
내게로 돌진하는 바람 앞에 실신했다.
나의 최선, 나의 소유, 나의 지능, 나의 성품. 무엇이든 내게 속한 것들은 그 바람 앞에 작은 나무 막대기
마냥 도무지 소용이 없었다. 나는 무능하고 억울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 것인가를 알 수 없어 한숨지었다. 처음 내게 바람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왔다.
내게 무릎 꿇는 일이란 그다지도 어려웠나 보다. 죽음의 문턱이 아니었다면 관절을 구부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이 불가능하였기에.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다 드는 수 밖에는 다른
할 일이 없었다.
그렇다. 고통은 섭리 안에 있고 고통은
나로 하여금 영원으로 눈 뜨게 하였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적지
않은 경우, 고통은 사람의 마음에 쓰디쓴 뿌리로 자리 잡고 그것으로 인한 독에 자신을 가두는 모습을
보아 왔기에.
지금도 나를
무릎 꿇게 하는 바람이 있다. 산 자에게 바람이란 오랜 친구 같은 것. 바람은 나의 약함을 더 깊이 알게 하는가? 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가?
또 다른 산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는가? 나는 그 고통으로 인해 자라고 있는가? 그로인해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내게 바람의 흔적은 상처일까,
영광일까?
시애틀의 겨울,
비바람이 종종 몰려온다. 양초와 장작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바람은 오고 또 사라진다. 이제야 제법 익숙해진 모양이다. 바람이 지붕 위를 소리치며
지나갈 때, 앞집 삼나무 머리채를 마구 흔들어댈 때도 장작불 속으로 고구마를 던져 넣는 여유를 부리기도 한다.
바람 없는 삶이 어디 있으랴. 다만
이 바람 속에서 더욱 익어가기를. 가마에서 나오는 날, 빛을 잘 반사하는 도자기로 나오기를. 바람은 주저앉으려는 나를 세워 하늘 한복판에 선이
살아있는 그림 한 점 남기기를.
*이 작품은 2017 한국일보 문예공모 수필 부문 당선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