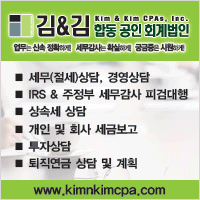공순해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회장)
개밥의 도리토
가을이 여물어 가고 있다. 사방에서 가을 색이 가슴 벅차게 쳐들어온다. 팔레트에 색깔 섞고 계신 분의 손길이 선연하다. 그 손길이 느껴지는 철이 되면 그림 하나가늘 떠오른다.
60년대 말, 용인 벌판. 조락(凋落)의 계절에 오른 여행길이었다. 그 빈 벌판 끝에서 인영(人影)이 떠오르더니 점점 가까워갔다.
지켜보는 사이, 그 인영은 피할 수 없는 밭둑에서 조우했음에도 곁도 안 주고 스쳐 지나갔다. 윤동주의 시구,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절로 떠올랐다.
몇 시각 전, 벌판 끝에 동그마니 세워진 교회가 유별하게 눈을 끌어 살짝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그가 뜨겁게 설교하고 있던 탓이었다. 어깨에 세상 괴리를 가득 진 듯 고개를 떨구고발을 끌며 지나가던 그.
그땐 교회 생활을 몰랐기에 그 모습이 의아했다. 사랑이 본체이신 분을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게 아니었나? 오랫동안 그 일은 기이한 모습의 그림엽서로 남았다.
요즘 비로소 그 의아함이 풀려가고 있다. 선배는 자주 괴리를 토로한다.
30여 년을 함께 했던 교우들이 이적(移籍)하는 걸 그냥 바라봐야 하는지, 자신도 떠나야 하는지, 교회 찾아 유랑하는 세태가 서글프다고. 왜 이런 세태가 반복될까.
복음을 선포하는 분도 이를 듣는 회중도 마음이 비어 있는 건 아닐까. 추상적으로 변질된 사랑. 복음을 전하는 분도 한 영혼에 관해 관심이 없고(롬 1/ 31에 분명 쓰여 있다.
‘무정한 자’, 이는 진노를 불러오는 죄라고.), 회중도 말로는 복음을 잘 알면서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선 확신이 없는 게 아닌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하셨건만 독신 출석자에게 목장 사역
그룹은 더욱 차갑다. 해서 오늘도 회중은 편리와 이해 상관을 찾아 유목민이 되는 게 아닌지. 이런 경우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한 바울의 말이 서로에게 큰 면죄부가 되는 걸까.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엔 적어도 관계를 맺어야 할 너와 나가 있고, 그 매개는 사랑이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힘으로 지속되는
존재다. 최근 재미있는 과학 기사를 읽었다.
인류의 조상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공존한 시간이 1500년 정도라며, 둘
중 하나가 도태된 이유를 흥미롭게 소개했다. 네안데르탈인은 각자 생존을 궁구했으나 호모사피엔스는 협업함으로
종족을 보존시켜 오늘의 현생 인류가 됐단다. 인간이 왜 서로 사랑을 나눠야만 하는 사회적 동물인가과학적
근거가 되는 기사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로 일하시는지 재빨리 이해됐다. 협업하시는 삼위일체께서 당신들의
방법대로 교회란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협업하도록 만드셨던 거구나, 쉽게 깨닫게 됐다. 협업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하기에 사랑 없는 공동체는 인간다운
욕망으로 어느 정도 유지 가능하나, 변질되어 추진력을 잃게 되기 쉽다.
이제 곧 세밑 세모가 닥친다. 사회 분위기는 아연 변하여 사방에서 복음이 오셨음을 캐럴로 알리고, 구세군의 자선냄비 온기가 시월 상달 떡시루 김처럼 피어 오를 테지. 그러나
세모가 지나면 연례 대로 돌아갈 것이다. 연중 없던 사랑이 연말만 되면 어디서 그리도 많이 몰려나올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유산으로 남겨 두고 가신 분도 있다. 23년 전 머킬티오의 한 목사님께서
지역 사회를 위해 무료 성탄 음악회를 여셨다. 복음의 궁극인 이웃 사랑을 보이셨다.
세상 뜨신 후도 유족들이 유지를 받들어 그 음악회를 이어 오고 있다. 이 음악회는 올해도12월 7일 오후 7시 30분 린우드에 있는 트리니티 루터란 처치에서 열린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23년을 이어 오는 동안 이 행사는 그 지역 사회의 전통이 됐다. 또한 이는 한인 사회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이를 소원한 눈으로 보는 한인들도 있단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고질적 병폐 아닐까.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하며 비교하는 교만. 올해는 이 음악회가 더욱 성황을 이뤄 서로의 사랑을, 한인들의 사랑을 나눴으면 한다. 이 행사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로 쓰인단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빈집> 기형도) 하며 혼자 가 버려 전설이 된 젊은이, 그가 절망하던 사회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현실. 개밥에 도토리가 맞지 개밥에 도리토가 아니다.
언제까지 개밥에 도토리처럼 광야를 걸을 것인가. 또한 기억의 그림엽서 속 그분도 아직 벌판을 걷고 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다.